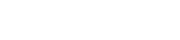more
 홈
기획
홈
기획
겨울 새벽 한파에 무너진 ‘꾸부정 인생’ , 구미시 봉곡동 ‘폐지 할머니’
김미자 cloverail@hanmail.net 기자
입력 2022.01.25 02:55
수정 2022.01.27 00:01

|
| ↑↑ 새벽길/ 불로그,사람과 삶 캡처 |
[새벽칼럼= 김경홍 k문화타임즈 발행인] 겨울 한파가 살갗을 파고드는 새벽, 굽이치는 새벽길에 리어카 한 대가 휘청거렸다. 바람이 몰아치자 리어카에 실린 종잇장들이 허공으로 날아올랐다가 가라앉았다.
그쪽으로 검은 그림자가 쓰러지듯 달려갔다. 맞은편에서 날아드는 오토바이가 경적을 울리면서 지나쳤다.
“할머니, 새벽길이 위험해요”
“누가 모르겠습니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어린 그것들을 어떻게 키울라구,,,”
더는 말을 이을 수 없었다.
식당 개업을 한 아들은 코로나19가 몰아치자, 문을 닫았다고 했다. 빚더미 신세가 된 부부는 결국 갈라섰고, 일자리를 구한다고 나간 아들은 1년째 감감무소식이라고 했다. 아들 부부가 떠난 자리에는 초등생인 2명의 손자만이 남겨져 있었다.
잠시 한숨을 돌린 ‘꾸부정 할머니’는 아련하게 서광이 비쳐오는 새벽길에 휘청거렸다. 한 가족의 파탄과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리운 손자들, 그 생의 무게를 리어카 가득 짊어지고 굽잇길에 휘청대는 할머니, 노을 지는 황혼길에서 걸어온 세월을 돌아보아야 할 ‘꾸부정 인생’이 머릿속에 스칠 때마다 가슴이 아려오는 2022년 1월 말이다.
1월 25일은 부가세 신고 마감일이었다. 한 푼이라도 덜 내려고 안간힘을 쏟던 1월 24일을 지나 밝아오는 25일 새벽, 문득 그 할머니가 뇌리에 스친다.
삶은 순간들의 집합체이다. 본질은 늘 그 자리에 있는데 생각은 하루에도 수백, 수천 번 희망과 절망을 오간다. 마치 시계추와 같다. 몰려들었다가 사그라지는 돌풍처럼 ‘나’라는 존재는 늘 그 자리에 있을 뿐이다.
어떤 이는 가난해서 못 살겠다고 한다. 그러나 들여다보면 하루 세끼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기본적인 경제력을 갖고 있다. 그 가난은 결국 상대와의 비교에서 오는 망상이며, 허상일 뿐이다.
2022년 1월 24일을 돌아보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 자아의 초상’이다. ‘꾸부정 인생’을 만난 그날 눈시울을 붉히면서 걸어간 새벽길이었지만, 내가 처한 작은 어려움 앞에선 그 슬프고 빈곤한 생은 존재하지 않았다. 오로지 나만이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뿐이었다.
며칠 후면 설이다. 코로나19로 홍역을 치른 많은 이들의 가슴은 더 아프고 고될 것이다. 하지만 생의 탄생이 아래로부터 오듯 행복이라는 생명도 아래에서 움트는 법이다.
자신보다 더 부유한 이들과 비교하며 자신을 학대하고 절망하는 우둔한 삶임을 생각한다. 항상 자신보다 못한 아래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희망과 사랑을 품어안자고 가슴에 다져놓는다.
품어안은 사랑의 보따리를 자신보다 못한 이들 앞에서 풀어놓는 삶, 그러나 자신이 없다. 삶은 영원할 것 같지만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저무는 햇살과 같은데도 말이다.
겨울 새벽 한파에 무너진 ‘꾸부정 인생’, 돌아볼수록 지금의 내가 부끄러운 날 새벽이다.
관련기사()
- 시사 칼럼/ 무엇이 도시의 얼굴을 만드는가?
- 백수 칼럼/ 44번 버스와 57번 버스, 그 운전자
- 장세용 구미시장의 ‘휴머니즘 대응 화법’,감동의 강물로 흘렀다
- 백수일기/ 인공지능(AI, 人工知能, Artificial Intelligence)
- 광복절, 제주도/ 아픈 흔적 곳곳에는 일본군이 남긴 상처와 4․3항쟁의 아픈 역사
- ‘현명한 새는 나무를 가려 둥지를 튼다’ 대권 후보의 자격 조건
- 시사 칼럼 / 일찍 핀 꽃이 일찍 시든다는 홍준표 의원과 김웅 의원의 우문우답
- 데스크 칼럼 / 70년대 유진산 신민당 총재는 ‘구상유치’, 2021년 민주당 정세균 전 총리는 ‘장유유서’
저작권자 K문화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01[단독]구미시 공단동 초교생 통학권 문제 내년 1학기부터 해소... 어떤 우여곡절 있었나.. 2024/11/22 10:42

-
02[기획] 경북 구미 발전 중심축 대이동, 신흥 도심은?.. 2024/11/24 01:00

-
03농업인을 울리면 울리게 한 정부는 ‘피눈물’.. 2024/11/22 21:04

-
04구미시 봉곡동 1천여 세대 S아파트 이면도로, 화물차 불법주차장 전락.. 2024/11/23 15:03

-
05[현장 스케치] 구미시새마을부녀회의 사랑담은 김장김치...어려운 이웃 식탁에 오른다.. 2024/11/22 1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