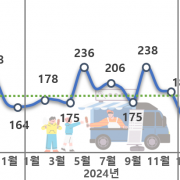more
김경홍

|
낙엽 가득 짊어진 가을바람이
귀가하고 있다. 몇 모금 피우다 버린 담배 연기
허공 몇 바퀴 휘어 돌다가 자취를 감추는
골목길 포장마차에 노쇠한 늦가을
저 혼자 술잔을 기울인다. 만남이 끊길수록 깊어지는 공간
그 속으로 진한 취기가 깊이 쓸려 들어간다
문을 걸어 잠그고 지그시 눈을 감는다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온 그림자
노크를 한다

|
언제부턴가 개천을 끼고 사는 마을에 말이 끊겼다
기다리다 지쳐 몸져누운 외출
어쩌다 집을 나설 때는 검고 흰 마스크에
신변을 숨겨야 했다
누런 종잇장에 신상을 적어놓고 들어가 보지만
식장 안은 예전 같지가 않다
하얗고 따스한 두 손을 깊이 집어넣은
육체들이 드문드문 앉아있다
숨 가쁘게 다가온 언어들이 눈가에 아주 미세한
수신호를 남겨놓고 돌아선다
때때로 119에 실려 간 누군가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들 중 한둘이 절름절름 다가와
손을 내밀지만 화답하는 것은 불문율

|
언제부턴가 그 작은 마을에 잠이 많아졌다
물살에 깎이다가 물살로 흐르는 모래톱처럼
뚜벅뚜벅 걸어들어와 문을 걸어 잠근 아주 작은 존재
미세하게 떨리다가 눈을 감는다. 요즘처럼
불면 깊은 날이 없었다

|
저작권자 K문화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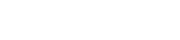





 홈
문화
홈
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