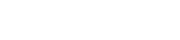홈
칼럼
홈
칼럼
[시사 칼럼] 깨어있어야 곳간을 지킨다
당심과 민심은 어디로...국민의힘 전당대회
[시사 칼럼=k문화타임즈 발행인 김경홍]악몽의 권력은 가고 없지만 시련의 아픔은 오랫동안 남아 있는 법이다. 마치 불길이 휩쓴 마을 뒷산과 흡사하다.
그러므로 ‘권불십년, 화무십일홍...’으로 시작되는 고사성어가 때로는 호사가들의 말장난일 수 있다. 핍박받는 국민이나 정치인들에게 십 년의 세월은 짧지 않을뿐더러 권력으로부터 상처를 입은 피해자의 아픔은 일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이게 한국 정치사의 현주소이다.
그래서 권력의 횡포는 가고 없지만 한국 민주주의라는 밭의 이랑에는 쏟아낸 피와 땀의 흔적이 지워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는 것이 아니던가.
한국의 정당사는 마치 질곡과도 같다. 대통령인 총재가 여당 대표를 임명하던 제왕적 정당정치로부터 당원이 당 대표를 선출하는 소위 민주시대로 진입하기까지는 무수하게 흘린 피와 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한완상의 ‘민중과 지식인’ 등 깨어있는 지식인들의 생생한 철학을 열독하면서 길거리로 나선 70~80년대의 수많은 젊은이가 과감하게 자신의 안위를 버릴 수 있었던 것은 “동물처럼 떼를 지어 다니는 군중의 본능으로서는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없다.‘ 는 가르침 때문이었고, 그 외침에 힘입어 군중은 의식있는 백성인 민중으로 진화돼 나갔다.
결국 이러한 피와 땀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는 민주시대로의 안내서를 입안하게 되었다. 또 이러한 여파는 여당총재인 대통령이 집권당의 대표를 임명하던 제왕적 권력을 당원들의 권리로 돌려주게 하는 당원 투표에 대한 정당 대표 선출제라는 민주적 정당사의 기틀마련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3·8일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로 향해 걷는 국민의힘의 행보가 마치 눈길을 가는 취객의 걸음걸이와 흡사하다. 자력으로 길을 헤치기는커녕 비탈길을 오를 때마다 특정 권력을 향해 밀어주고 끌어달라고 읍소를 해댄다. 이뿐이 아니다. 자신을 바싹 따라오거나 앞서가는 이들과 선의의 경쟁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권력의 힘을 빌려 발을 걸어 넘어뜨리거나 낭떠러지로 걷어차기 일쑤이다. 독재권력의 습성이다.
이러다 보니, 출발 전 자신이 구상하고 계획한 길의 설계 도면은 오간 데가 없다. 결국 당의 혁신과 당원의 행복을 위해 쓰여야 할 ‘대표로서의 권력’ 은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변질되고 마는 것이다.
권력의 속성은 공동소유와 공동분재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각있는 국민들은 독재 권력을 민주 권력으로 바꿔놓기 위해 피와 땀을 흘려댔던 것이 아닌가.
권력의 이면에는 ‘쥐를 잡으려고 기르는 고양이가 잡으라는 쥐는 잡지 않고 밥상의 고기만 노리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당 대표라는 권력을 당원과 국민 행복을 가꿀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목적으로 삼는 한 국민의힘의 미래는 없다. 동물의 본능과 흡사한 군중의 심리를 극복한 의식있는 민중이 백성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의 꽃을 피운다고 외치던 한완상 선생등 의식있는 학자들의 외침이 그리워지는 시절이다.
당원이 깨어있어야 당의 권력이 당원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게 되는 법이다.
-
01구미시 2025년도 당초예산 사상 최대규모... 도내 주요 지자체와 비교해 보니.. 2024/11/25 17:59

-
02[기획] 경북 구미 발전 중심축 대이동, 신흥 도심은?.. 2024/11/24 01:00

-
03구미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어르신 전당’ 맞나... 보건복지부 시설평가 세 번 내리 최하위.. 2024/11/26 22:51

-
04‘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자’ 구미시의회 장천면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동의안 일단 부결.. 2024/11/27 12:20

-
05구미시 의용소방대원 지원하려면 제대로...장미경 의원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2024/11/27 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