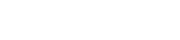홈
문화
홈
문화
[이복희 수필집· 연재] 내성천에서는 은어도 별이 된다 (5)
된장찌개
된장찌개는 잘 발효된 된장에 갖은 재료가 어우러져야 맛깔스럽게 끓여진다. 어떤 재료라도 빠지면 밍밍해서 깊은 맛이 나지 않는다. 용기 또한 뚝배기라야 수저를 놓을 때까지 식지도 않거니와 친밀감과 푼푼함까지 느껴지고, 투박한 질감이 보는 맛도 더해준다. 아무리 먹어도 물리지 않는 음식을 꼽으라면 당연히 된장찌개다.
객지에 나가 있는 딸내미가 집밥이 먹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한다. 사먹는 밥이 한두 끼면 물린다는 것을 왜 모를까. 갓 지은 밥에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두어 숟갈 넣고, 열무김치에 고추장 한 숟가락과 참기름 한두 방울 떨어트려 쓱쓱 비벼 먹는 맛을 어찌 잊을 수 있을까. 끼니때마다 아이들이 생각나고 특별한 음식을 하게 되면 한 그릇 갖다 먹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
마침 징검다리 연휴였다. 집에서 빈둥대며 보내기엔 아까웠다. 집안의 바람잡이인 내가 또 바람을 일으켰다. 남편을 꼬드기고 아이들도 살살 구슬렸다. 대전에 있는 아이가 구미로 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번거로움을 피해 서해로 가족여행을 결정했다. 다니는 것을 싫어하는 남편은 펜션을 알아보다가 포기하고 맛있는 것 사먹으면서 그냥 집에 있자고 했다. 한번 마음먹은 일은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나는 SNS상 대천해수욕장 근처 펜션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뒤지며 전화를 걸었다. 같은 말을 수십 번 되풀이한 끝에 예약이 펑크 난 펜션을 구했다.
아침부터 딸아이 가져다주려고 밑반찬은 물론이고 특별히 정성 들여 된장찌개를 끓였다. 뚝배기째 가져가면 얼마나 반길까, 생각만으로도 즐거웠다. 빨리 식혀서 아이에게 가져갈 요량으로 바람 잘 들어오는 베란다 창틀에 올려뒀다. 바람을 타고 코끝에 전해지는 찌개 냄새에 군침이 돌았다. 맛있게 먹을 아이의 얼굴이 떠올라 절로 미소가 피어났다.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소리가 내 새끼 입에 밥 들어가는 소리라 했다. 나도 부모가 되고 보니 그러했다. 다른 짐들을 다 챙기고 출발할 때 절대 잊지 말아야지 했다.
콧노래를 부르며 십여 분을 달렸을까.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었다. 가스 밸브를 떠올리고, 비상등을 떠올리고, 고슴도치 밥을 주고 왔나 등등 머릿속에서 집 안 구석구석이 한 바퀴 돌았다. 찰나, 정수리로부터 뒷머리로 섬광같이 지나가는 것이 있었다.
“아차!, 된장찌개!”
이런 정신머리. 괜히 뒷머리를 긁적였다.
“차 돌릴까?”
남편이 말했다. 어쩔 수 없는 것, 그만 잊으라는 뜻일 터이지만 왠지 비아냥으로 들려 찜부럭이 났다. 이미 차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지 않은가. 뒷좌석의 둘째가 “언니는 된장찌개도 못 끓여 먹냐.”며 딴은 위로한답시고 거들었지만 아쉽기는 매한가지였다.
차는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고속도로를 미끄러지듯 잘도 달렸다. 뒷좌석에 앉은 아이들의 재잘거림으로 된장찌개에 대한 미련을 삭힐 수 있을까 싶었지만, 여행 내내 창틀에 올려놓은 된장찌개가 마음에 걸렸다. ‘바람에 쏟아지지 않았을까. 한여름이라 벌레가 생겼을지도 몰라.’ 아이들과 바닷가를 거닐 때도 폭죽놀이를 할 때도 잠자리에 들어서도 문득문득 머릿속에 된장 뚝배기가 어른거렸다.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된장찌개가 어린 날의 밥상을 불러냈다.
다섯 남매는 두리반에 둘러앉아 어머니가 끓여주신 된장 뚝배기에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숟가락이 들락거렸다. 갖은 반찬이 아니라도 김치에 된장찌개 하나만으로도 꿀맛이었다. 내남없이 밥 한 공기를 게눈 감추듯이 뚝딱 해치웠다. 입천장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퍼먹던 어머니의 손맛이 배인 구수한 된장찌개가 오늘따라 간절히 생각난다. 뚝배기 속의 된장찌개만 먹은 게 아니라, 그 속에 녹아든 어머니의 사랑을 퍼먹은 것이리라.
집에 돌아오자마자 베란다로 나갔다. 창틀의 된장찌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지질한 국물에 두부며 채소가 말라 간다. 진한 군침 돌게 하던 것이 지금은 심한 악취를 풍기고 있다. 그래도 미련이 남아 혀끝으로 맛을 보는 순간, 미간이 절로 찡그려졌다. 싱크대에 붓고 나니 딸아이에게 먹이지 못한 아쉬움이 새삼 짙게 밀려온다. 아쉬움 때문일까, 문득 된장찌개는 우리 ‘가족’과 같다는 상념에 잠긴다.
된장찌개의 맛을 좌우하는 된장은 우리 집의 안주인인 내가 아닐까. 땅의 기운을 고스란히 받아 담백한 맛을 내는 호박이 큰딸이다. 우리에게 아빠와 엄마라는 호칭을 처음으로 불러준 아이다. 호박이 들어있지 않은 된장찌개는 뭔 맛이 나겠는가. 우리 집안의 양념이자 어느 자리에선 빠지면 섭섭한 기분이 드는 작은 딸이 파 같은 존재이다. 감칠맛 나는 재료의 맛을 다 아우르는 두부가 아들 녀석이다. 이 모든 맛을 한 곳에 담아낼 그릇인 뚝배기가 남편이다. 세 아이와 나의 든든한 후원자이며 늘 바람막이가 되어 주는 그에게 담겨 우리 가족은 맛난 된장찌개로 거듭난다. 그리고 서로에게 살맛이 되어 준다.
오늘도 된장찌개는 뚝배기에 담겨 보글보글 끓고 있다.
⇁⇁⇁이복희 작가(시인 수필가)⇁⇁⇁⇁
![]()

경북 김천 출신이다. 2010년 ‘문학시대’에 수필, 2022년 계간‘시’에 시가 당선되면서 한국 문단에 명함 (수필가·시인)을 내밀었다.
시집으로 ‘오래된 거미집’, 수필집으로 ‘내성천에서는 은어도 별이 된다’를 출간했다.
릴리시즘의 정수를 잘 보여준다는 평을 얻는 작가로 경북 구미와 경기 동탄을 오르내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
01구미시장 선거 전초전 돌입 대부분 낭설 하지만, ‘설 속에도 뼈가 있다?’ 설중유골設中有骨.. 2025/09/07 08:44

-
02[분석]금오산 도립공원 방문객 6년간 154만 급감 충격적, 이유는?.. 2025/09/05 08:35

-
03치유관광산업이 대세, 금오산 경북환경연수원 치유(힐링)호텔 활용 여론 확산.. 2025/09/06 10:50

-
04구미시 인구 3개월 연속 증가세 유지, 비수도권 지자체 중 유일.. 2025/09/05 15:12

-
05구미시 도량2동 30년 숙원 과제 주차난·차량 정체 해소.. 2025/09/06 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