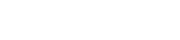홈
정치
홈
정치
[새벽편지] 김장호 구미시장과 민주당 구미갑을 지역위원회, 길을 찾을 수 없거든 ‘엽전 세 닢의 지혜를 빌려라’
[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 발행인(시인 소설가) 김경홍] 조선시대 어느 영의정의 집에 젊은 선비가 며칠간 묵게 됐다. 영의정에겐 수발을 드는 여종이 있었다. 하지만 비천한 신분과는 어울리지 않는 뛰어난 미모와 범상한 생각과 말투, 또렷한 눈빛은 어느 양반가의 규수閨秀와 비교해도 모자람이 없었다. 선비의 관심을 끌기에 족할 만도 했다.
여종에게 마음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챈 영의정이 어느 날 선비에게 이런 제안을 했다.
“세 닢을 줄 터이니 3일 안에 방안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물건을 사 오도록 해라. 그러면 여종의 노비 문서를 불태워 수양딸로 삼고, 그대와 혼인을 허락하도록 하겠다”
어느 날 식사도 거른 채 고민을 하는 이유를 선비로부터 캐물은 여종은 밥상을 들고 나가면서 잠시 촛불을 응시하다가 미소를 머금었다. 여종의 미소 짓는 이유를 총명한 선비가 모를 리 없었다.
약속한 날, 영의정과 선비가 만난 별채의 방안은 짙은 어둠이었으나, 선비가 촛불을 밝히자, 방안 전체가 빛으로 가득했다. 선비를 바라보는 영의정의 얼굴에 웃음이 넘쳤다.
그날 방안을 가득 밝힌 촛불은 엽전 세 닢으로 구입한 양초였다.
구미시와 여야 정치권이 상생협의체 혹은 정책간담회의 닫힌 문을 열 열쇠를 찾지 못하고 있다. ‘엽전 세 닢으로 방안을 가득 채울 물건을 살 수 있는 지혜’를 찾아야 한다. 스스로가 지혜의 샘을 찾지 못한다면 누군가로부터 지혜를 빌려와야 한다.
지혜는, 많이 배우거나 높은 지위에 있는 자만이 소유한 전유물이 아니다. 어쩌면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소위 조선시대의 여종처럼 평범한 이들이 더 많은 지혜를 갖고 있을는지 모른다. 세상을 지배해 왔고, 지배하는 철학의 발원지는 순수의 샘물이어서 그렇다.
시장이나 시의원보다는 간부 공무원이, 간부 공무원보다는 하위직 공무원이 더 소중한 지혜의 샘을 갖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소통은 꽉 막힌 통로를 열어젖히는 열쇠를 주기고 하고, 주저앉은 절망을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된다. 욕심을 버릴수록 근원을 찾게 되고, 근원을 찾게 되면 해법이 생기는 법이다.
중앙정치와 자치단체의 흥망성쇠는 문턱을 낮춘 소통 정치, 혹은 소통 행정에 얼마나 무게를 두었느냐에 달려 있다. 문턱을 낮추면 상대를 존중하게 되고, 문턱을 낮추어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순수한 존재들로부터 ‘엽전 세 닢의 지혜를 빌릴 수 있는 법’이다.
손가락을 보기보다 손가락이 가리키는 산을 올려다보는 혜안도 지녀야 한다. 길게 보며 사안을 결정짓는 미래 가치관,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하는 지도자의 품격을 지니란 말이다.
시민들이 천 원짜리 한 장을 내밀면서 방안을 가득 채울 물건을 사들이라고 한다면, 구미시와 여·야 정치권은 어떤 지혜를 발휘할 텐가.
-
01[속보] 구미 출신 심학봉 전 의원 복권 확정.. 2025/08/11 16:21

-
02[이슈 & 이슈] 대경선! 구미 자금 실어 나르는 대구의 실크로드, 탄식하는 구미 소상공인들.. 2025/08/12 08:38

-
03[새벽편지] 김장호 구미시장과 민주당 구미갑을 지역위원회, 길을 찾을 수 없거든 ‘엽전 세 닢의 지혜를 빌려라’.. 2025/08/11 08:18

-
04[사설] 구미시 기간제 근로자는 산재로부터 안전한가? 글쎄다.. 2025/08/10 08:59

-
05반려동물구조협회 동물학대 규탄대회 예고하자, 구미시 ’근거없는 일방적 주장‘ 일축.. 2025/08/10 13:00./images/common/basics_img.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