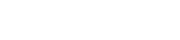홈
칼럼
홈
칼럼
[새벽편지] 시월의 마지막 밤...잎이 지듯 삶 또한 그렇다
[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 = 발행인 김경홍] 오랫동안 앓던 형을 묻고 오는 길이었다. 멀리 능선에 시선을 두고 눈물을 훔치던 아버지는 삽을 둘러매고 강가로 향했다. 그리고 오래오래 푸르른 저녁 강에 삽을 씻은 아버지는 어린 내 손을 꼭 부여잡고 지평선을 휘영청 휘어 돌았다.
어린 시절의 아버지는 하필 가까이 있는 샘터를 마다하고 둔덕을 넘고 또 넘어 강가로 향했던 것일까. 그 이유를 알게 된 것은 육신의 눈이 어두워 오면서 차츰 마음의 눈이 뜨이기 시작한 나이에 이르러서였다. 지천의 물이 흘러들어 강물로 흐르듯 삶 또한 흐르는 강물과 같은 것이었음을...
강가로 향하던 아버지의 마음을 그 옛날 깨달았다면, 남과 싸우려고 하기보다 화목해지려고 애 썼을 것을...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남의 즐거움을 뺏지 않았을 것을... 더 많이 누리려고 나보다 못한 이들의 삶을 짓밟지 않았을 것을...
세월이 흐르기 전, 강가로 향하던 아버지의 마음을 그때 읽었더라면.
불심이 깊은 아내가 출근하는 내게 타이른다.
“여보, 삶, 내일은 없어. 바로 여기, 바로 지금이 삶이야.”
영원한 삶이 없듯 영원한 권력도 없다.
대통령도, 자치단체장도, 시의원도 5년이고 많아야 10년이다. 그러므로 누리고 있을 때 겸손지덕해야 하고, 살아 있을 때 나보다 남을 위한 삶을 살 일이다.
세월이 흘러 필자가 만난 전직 시장과 전직 국회의원, 돈 많다는 졸부 또한 꺼내는 말은 공히 이랬다.
“삶, 별것 아닐세. 지나고 나니 그런 것이었네”
그들 또한 권력과 부를 누리고 있던 그날, 그 사실을 그때 깨달았다면, 그들 때문에 억울해하고, 그들 때문에 아파하고, 그들 때문에 세상을 등진 이들은 없었을 것을...
시월의 마지막 밤이다. 곱게 물든 단풍들, 늦가을 바람에 몸을 내준다. 낙엽을 밟는 소리가 잠을 설치게 하는 가을밤이다.
잎이 지듯 삶 또한 그렇다.
-
01‘생활 현장 곳곳에 내걸린 고맙다는 현수막’ 그 주인공이 궁금하다.. 2025/07/27 17:44

-
02[단독] 금오산 대혜폭포 출렁다리·금오산 짚라인 설치사업 차질 불가피.. 2025/07/26 17:41

-
03[카메라 고발]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 혹시 폐쇄했나(?)...곳곳에 잡초, 운동기구는 깨지고 부서지고.. 2025/07/26 23:23

-
04[기획]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번만 같아라’... 모범답안 제시한 24일 구미시의회 시정질문.. 2025/07/25 17:39

-
05돈이 부족했나 김천시, 20대 신혼부부에게만 1백만 원 준다는 청년지원 정책.. 2025/07/27 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