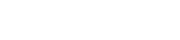more
 홈
칼럼
홈
칼럼
[새벽칼럼] 늘그막에 4→ 시적 사유와 그리고 자살
김미자 기자 cloverail@hanmail.net 기자
입력 2024.06.25 11:29
수정 2024.06.25 11:31
[김영민=K문화타임즈 상임고문/ 대구·구미YMCA 전 사무총장] 시적 사유의 본질에는 어떠한 인공적인 조작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세계의 근원적인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에 대한 본능적인 인식이 내재해 있는 것이다.
시인은 바로 이러한 근원적인 아름다움에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그것을 보존하기 위한 싸움에 헌신하는 이라고 할 수 있다.
 |
|
『시적 인간과 생태적 인간』(김종철, 2020, 삼인)
아무런 목적이나, 어떤 연결도 없는 먼 길을 걷고 있는 마음입니다.
시의 경지, 시의 영역을 학자의 “가장 근원적인 아름다움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인간의 손으로는 건드려서는 안될 것 같은”
시의 마음과 삶에의 모습도, 더불어 죽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도 내, 도무지 갈피를 찾지 못하는 조각조각 마음을 어찌해야 합니까?
대구 청소년 쉼터에 있던, 글을 만드는 솜씨가 뛰어난, 그러면서도 동료나 선생들을 아프게 감싸주었던 어린 친구가 쓴 책의 내용같이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버려진, 그래서 이곳, 저곳에서 이런, 저런 모습의 거침을 모두 겪으면서, 수 차례 손목에 면도칼로, 방안에 연탄을 피워 죽음에 찬가를 부르는 안타까움이 끊이지 않다가 그러면서도 스스로에게 시로, 소설로, 수필로 마음을 드러내고 손잡아주기를 애원하던 그 10대를 끝내지 못한 가날픈 들꽃이 있는데.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고 몸을 웅크려 무릎을 안고 잔다
그러고 있으면 꼭 엄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온 것 같은 착각이 든다.
생에서 가장 안정적인 순간이었다.
꿈은 꾸지 않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수면의 세계에는 어둠만이 가득했다.
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소녀의 붉은 피의 책이 내 손에서 춤을 추는데.
( 김진이(가명) 『내 생애는 찰라에 끝난다』, 2020)
로리 오코너(2023, 『마지막 끈을 놓기 전에』)는 “자살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놓인 삶의 조건은 물론, 스트레스를 일으킨 사건과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이고 이는 죽음을 갈망하는 행위가 아니라 견딜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끝내려는 행위라고.......
지난해 하지를 하루 앞둔 날 대낮의 더위가 대구를 삼키려는 날 큰형님의 맏딸, 이제 60을 바라보는 조카의 비보를 접했습니다.
같은 대학, 같은 과, 프랑스에서 몇 년을 같이 수학하고, 결혼하고는 건축사무실도 같이 사용하면서 대학에서 가르치는 일에, 애쓰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지난 해 여름 이맘때 쯤(같은 종류의 일을 하던 상황에서) 문제점을 나누다가는 문득, ‘삼촌’ 손을 붙들며 ‘몇 년 전 이혼했다’는 말을 하면서 허탈해 하던 모습, 이유도 없고 다만 이렇게 사는 삶에 대한 원망과 같은 무게의 서글픈 이야기를 들은 것이 전부였지요.
근간 연락이 없었던 것, 무소식 곧 희소식이라는 핑계로 연락도 없이, 그것으로 위안을 삼았는데 우울증이 아파트에서 그녀를 뛰어 내리게 했답니다.
같은 길을 가던(일정한 기간이었지만) 유일한 혈육이고, 가장 가깝게 느꼈던 맏형의 딸,
강보에 쌓여있을 때 안아보았던 기억이 생생한데.
한여름의 햇살 같은 죽음을 보았네
꺼이꺼이 울어도 풀리지 않는 멍울이 자발머리 없지만
부박하다고
해망스럽다 해도 통곡이 아니면 물결이 흩어지지 않습니다
저작권자 K문화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01이철우 지사 ‘암 극복하는 큰 선물 주시라’ ... 이 대통령 ‘암을 낫게 해 드려야죠’.. 2025/08/02 08:44

-
02[분석] 구미 지방선거, 민주당 운동화 끈 조여 매자 긴장하는 국민의힘.. 2025/07/31 09:23

-
03[사설] 상가 앞 도로변 잡풀 민원까지 읍면동이 들어주어야 하나.. 2025/08/02 14:24

-
04포항 침통, 영천 불안, 구미 안도, 농촌 예의주시... 한미 관세협상 타결.. 2025/07/31 18:02

-
05김천시청 가서 배우라는 손가락질은 ‘옛말’... 요즘은 ‘구미시청 와서 배워라’.. 2025/08/01 0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