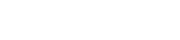홈
문화
홈
문화
[이복희 수필집· 연재] 내성천에서는 은어도 별이 된다 (2)
50원짜리 인연
몇 남지 않은 은행잎이 가지에 매달려 있다. 노랑나비의 마지막 날갯짓처럼 애처롭다. 고등학교 1학년의 늦가을도 그처럼 가슴이 시렸다. 혼자 걷는 것을 좋아했는데 왠지 그날은 내키지 않았다. 은행잎 양탄자에 눈길을 떨구고 뚜벅뚜벅 버스정류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누군가 내게 인사를 건넸다. 한 남학생이 수줍은 눈빛으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자칫 콧방귀를 날리고 쌩 모른 척할 뻔했다. 그러기엔 그의 행동이 꽤 진지해 보였다. 같은 학원에 다니는 남학생이었다. 얼굴과 이름 정도만 아는 사이였다. 까불거리거나 거들먹거리는 남학생들과는 달리 그는 있는 듯 없는 듯했다. 마주치면 설핏 웃기만 해서 나도 그렇게 지나쳐 왔었다.
눈인사만 건네고 버스가 오는 쪽으로 시선을 고정했다. 뒤에 멀찍이 서 있는 그의 시선이 나에게 꽂혀 있기라도 하듯 신경이 쓰였다. 버스가 왔다. 냉큼 먼저 올라타서는 안내양에게 버스비를 냈다. 100원을 주면서 50원을 거슬러 받기가 좀 머쓱했다. 그래서 그의 차비를 내주었다. 아무 말도 못하고 고맙다는 표정을 짓는 그가 싫지 않았다. 서로 멋쩍어 창밖만 바라보고 서 있었다. 스치는 풍경보다 자꾸 그쪽으로 가는 시신경을 당겨오기에 바빴다. ‘이대로 버스가 계속 달려줬으면…….’ 잠시 엉뚱한 마음도 들었다.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레미 드 구르몽의 시구가 내내 귓바퀴에서 작은 속삭임으로 맴돌았다. 가만히 놔둬도 뒤숭숭한 사춘기인데 갑자기 일어난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공부할 양으로 도서관에 앉았지만,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다. 하굣길에 버스정류장으로 가는 발길을 막을 수 없었다. 혹시나 하는 나의 기대를 그는 저버리지 않았다. 부끄러워하는 몸짓에 조용한 웃음으로 날 반겼다. 나란히 버스를 기다리며 공연히 단화 끝으로 땅만 팠다. 바닥에 누운 은행잎을 발끝으로 모아 작은 돔을 만들기도 했다. 버스가 오자 이번에는 그가 먼저 버스에 올랐다. 안내양에게 버스비를 내면서 ‘뒤에 타는 여학생 것도요.’ 했다.
그날 이후 난 버스를 타지 않았다. 40여분이 걸리는 길을 걸어서 다녔다. 남학생을 사귀는 친구들이 곱게 보이지 않은 것도 한 이유였고, 자주 마주치면 이상한 감정에 휩싸일 것 같아 두렵기도 했다. 외로우면 더 외롭게, 괴로우면 더 괴롭게 괜한 무게 한번 잡아보는 것도 사춘기의 멋이라 여겼다. 빈대떡 뒤집듯 마음을 고쳐먹었지만, 그래도 속은 휑하기만 했다. 집으로 가려면 그가 다니는 학교를 지나야만 했다. 며칠 후, 우연히 길에서 그를 만났다. 그날도 눈인사와 미소로 인사를 건넬 뿐이었다. ‘바보!’ 야속했다. 그리고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다.
8년 후, 그가 나타났다. 스물다섯 살의 건장한 청년으로 내 앞에 섰다. 기적 같았다. 버스정류장 앞 다방에서 만나기로 했다. 아무리 진정시키려 해도 가슴 속 방망이질이 잦아들지 않았다. 교복에 까까머리 수줍음 많은 남학생은 온데간데없었다. 진지하고 믿음직스러웠다. 소리 없이 입꼬리가 올라가는 미소는 그대로였다. 8년 공백의 어색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그와 나의 연결고리인 초등학교 동창에게 건하게 술이라도 한잔 사야 할 것 같다.
우리의 데이트는 경부고속도로와 경부선철도를 오갔다. 수원이 직장인 그와 대구에 사는 나는 주말마다 대전에서 만났다. 내가 고속버스를 타고 올라가서 만나고 내려올 때는 대구까지 그가 바래다주고 다시 기차를 타고 올라갔다. 함께하는 시간은 짧았지만, 오가는 설렘의 여운은 길었다. 만약 학창시절부터 만나왔다면 지금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 당시 남학생을 사귀던 친구들의 만남이 그리 오래 가지 않은 걸 보아왔다. 그러고 보면 그때 비껴간 인연이 지금 다시 만남의 장을 열어준 것 같다.
맞선을 본다는 그의 말은 충격이었다. 부모님의 권유라지만 배신감마저 들었다. 좋은 감정으로 만나왔지만, 아직 장래를 약속하기엔 이른 것 같았다. 내가 가지기엔 뭔가가 부족한 듯하고 남 주기엔 아까운 심정이랄까. 선보는 전날 저녁을 먹으면서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니 맞선 잘 보라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했다. 씁쓸하고 복잡한 기분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전화가 왔다. 선은 잘 봤냐고 하니까,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서…….”라며 마음을 털어놓는 것이었다. 간밤 뒤척이며 끙끙거렸던 체증이 싹 내려가고, 절로 입꼬리가 올라가며 뿌옇게 안개 낀 시야가 환해진 느낌이었다.
어머니가 매우 편찮으셔서 그는 결혼을 서둘러야 했다. 맞선을 봐서라도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해드려야 한다고 했다. 자신의 상황을 차근차근 얘기하는데 진솔함이 느껴졌다. 8년 전의 이야기도 털어놨다. 그때 부모님께 내 이야기를 했더니 나를 데리고 와보라고 하셨단다. 그 말에 마음이 반은 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버스를 타지 않고 걸어 다닐 때 버스정류장에서 날마다 어둠이 내릴 때까지 나를 기다렸다는 말에 완전히 넘어가고 말았다.
살아가면서 만나 할 사람은 언젠가는 꼭 다시 만나게 되는 것 같다. 부모님께서 나보고 맞선을 보라고 해도 거절해 온 것이 그를 다시 만나려고 그랬나 보다. 불가에서는 ‘인(因)’은 직접적인 원인이고 ‘연(緣)’은 간접적인 원인이라고 한다. ‘인연’은 하늘이 만들어주지만, 이어가는 것은 사람의 몫인 것 같다. 좀 어긋났다고 인연의 끈을 무 자르듯 싹둑 자르는 게 아니라, 소중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승화시켜야 하는 것이 아닐까. 버스비 50원이 우리에게 소중한 인연을 맺게 해주었다. 일 년 후 우리는 더 풀리지 않는 서로의 끈에 꽁꽁 묶여 버렸다.
세월이 흐르고 나는 지금 그 버스정류장에 서 있다. 버스가 바람을 일으키며 휙 지나간다. 노란 은행잎이 나풀나풀 떨어져내린다. 이런 날이면 왜 버스를 타고 싶어지는 것인지. 그날은 그와 만남을 예견한 것처럼 그곳에 이끌러 갔었다. 그 이끌림은 신의 섭리였을까. 부부의 연을 맺게 해 준 50원짜리 인연에 깊이 감사한다. 오늘도 내일도 서로를 마주 보며 더 깊이 품을 것이다.
⇁⇁⇁⇁이복희 작가(시인 수필가)⇁⇁⇁⇁
 |
||
시집으로 ‘오래된 거미집’, 수필집으로 ‘내성천에서는 은어도 별이 된다’를 출간했다.
릴리시즘의 정수를 잘 보여준다는 평을 얻는 작가로 경북 구미와 경기 동탄을 오르내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
01[분석] 구미 지방선거, 민주당 운동화 끈 조여 매자 긴장하는 국민의힘.. 2025/07/31 09:23

-
02포항 침통, 영천 불안, 구미 안도, 농촌 예의주시... 한미 관세협상 타결.. 2025/07/31 18:02

-
03이철우 지사 ‘암 극복하는 큰 선물 주시라’ ... 이 대통령 ‘암을 낫게 해 드려야죠’.. 2025/08/02 08:44

-
04김천시청 가서 배우라는 손가락질은 ‘옛말’... 요즘은 ‘구미시청 와서 배워라’.. 2025/08/01 08:35

-
05보수층 결집 겨냥 경북 구미 방문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2025/08/01 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