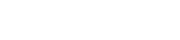홈
문화
홈
문화
[새벽칼럼] 고향 상주, 성묘가는 길...말 없는 아버지와 말이 없는 아들
[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 상임이사 김정원] 해마다 9월 늦밤이면 열린 문 틈새를 비집고 날아드는 귀뚜라미와 그 소리 혹은 노래. 그는 마치 노련한 낚시꾼과 같다. 그가 세월의 수심 속으로 낚싯줄을 드리우자, 몰려온 추억들이 입질을 해댄다.
타지로 떠나는 아들을 떠나보내던 어머니와 문설주에 곰방대를 두들기던 아버지의 굵은 기침, 허기를 채워주던 꽁보리밥과 된장을 찍어내던 오이와 풋고추. 파란 하늘을 떠받든 감나무와 주렁주렁 매달린 열매들.
고향 상주의 시골 동네에는 유난히도 감나무가 많았다. 능선 너머로 흘려보내는 새털구름이 아련한 추억들을 그려내는 뒷동산이 참 아름다운 마을. 내일 내일하다 보니 일 년이 흘렀다. 그래서 향하는 마음이 착잡하다.
60대의 아버지와 30대의 아들을 실은 승용차가 국도로 들어섰다. 가을바람에 실린 벼 이삭이 물결을 이뤄낸다. 이따금 참새떼가 날아오르는 하늘이 파랗게 곱기도 하다.
“그동안 잘 지냈어.”
“네”
“회사 사정은 괜찮고?”
“월급은 꼬박꼬박 나와요.”
그 말을 꺼내려고 60대의 아버지는 많은 생각을 짜내야 했다.
처음 꺼내려던 말은 “결혼 계획은 없어”서였다. 하지만 심정을 상하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말렸다.
“적금은 들고 있니” 하려고도 했다. 그러나 그 또한 아차, 하는 걱정 때문에 접기로 했다.
두어 마디를 꺼내기까지 60대의 아버지에게는 많은 생각들이 무수하게 교차했다.
“서울에서 전세라도 구하려면 수억은 들어갈 테고, 결혼 계획을 말해줘야 몇 마지기 논밭이라도 팔아 도움을 줄 텐데. 경기가 어렵다고들 야단인데, 다니는 회사 사정은 어떤지...” 그래서 꺼낸 말이 압축해 낸 ‘회사 사정, 월급’ 등이었다. 말을 길게 하면 간만에 만난 부자의 정에 금이 갈 수도 있겠지, 하는 우려가 60대 아버지의 입을 틀어막은 것이다.
한 시간 반을 달려 국도를 빠져나온 승용차가 시골길로 들어서자, 길 양옆으로 감나무들이 떼 지어 일 년만의 객 아닌 객을 맞았다. 짧지 않은 그 시간 동안 60대의 아버지와 30대의 아들이 나눈 대화는 단 두 문장이었다. 그러나 그 짧은 대화를 하기까지 60대 아버지는 장편소설 분량의 생각을 거듭해야만 했다.
그래서 그 60대의 아버지도 30대의 아들에겐 ‘무뚝뚝한 존재’로 낙인이 찍힐 수밖에 없었다.
그 60대의 아버지를 길러낸 그 아버지도 무뚝뚝하기는 매한가지였다. 가방 하나를 달랑 둘러매고 상주역으로 향하던 그날 새벽, 60대의 아버지의 아버지도 그랬다.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조심하거라.”
짧게 말을 마친 아버지의 아버지는 담 배연기를 길게 뿜어내면서 먼 하늘만을 쳐다볼 뿐이었다. 동구 밖까지 따라 나와 떠나는 아들을 품어 안은 어머니, 한 시간 넘게 쏟아내던 어머니의 근심 걱정과는 딴판이었다. 그래서 60대의 아버지에게 아버지는 ‘무뚝뚝한 존재’로 각인이 됐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 새벽이슬을 헤치며 뒷동산 넘어 밭으로 향하던 무수한 아버지와 현관문을 바쁘게 나서 마치 야시장 같은 ‘적자생존’의 세상으로 향하던 무수한 아버지들.
그 아버지들은 ‘말이 없는 무뚝뚝한 존재’였지만, 등록금과 전월세 자금,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삶의 현장에서 생존과 싸워야만 했던 전사, 밀려드는 근심과 걱정의 오르막을 오르고 또 오르며 싸워야만 했던, 그래서 생각은 많지만, 말이 없던 ‘무언의 전사’들이었다.
추석 명절 연휴, 한 달 혹은 두 달, 일 년 만에 그 말 없는 아버지를 만나는 아들과 딸들에게 권하고 싶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라는 짤막한 인사보다는 생활고에 휜 등을 두들기며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를 길러내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길래‘로 시작하는 마음 씀이 감동을 자아내는 대화.
“담배 끊으세요, 술 덜 마시세요”로 시작한 말문이 “오래오래 사셔야 저희가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시지 않겠어요.”라는 일상의 대화로 이어지도록 마음의 문을 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어떨까.
우리들의 아버지 무뚝뚝한 존재가 아닌 근심 걱정을 등허리에 둘러매고 삶의 오르막을 오르는 근심 많은 외로운 존재들이다.
-
01[분석] 구미 지방선거, 민주당 운동화 끈 조여 매자 긴장하는 국민의힘.. 2025/07/31 09:23

-
02포항 침통, 영천 불안, 구미 안도, 농촌 예의주시... 한미 관세협상 타결.. 2025/07/31 18:02

-
03이철우 지사 ‘암 극복하는 큰 선물 주시라’ ... 이 대통령 ‘암을 낫게 해 드려야죠’.. 2025/08/02 08:44

-
04김천시청 가서 배우라는 손가락질은 ‘옛말’... 요즘은 ‘구미시청 와서 배워라’.. 2025/08/01 08:35

-
05보수층 결집 겨냥 경북 구미 방문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2025/08/01 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