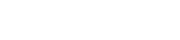홈
칼럼
홈
칼럼
[새벽칼럼] 엄마와 감자
어머니의 굽은 허리를 처음 편 곳은 영안실이고 화장장이었는데...
[김영민=K문화타임즈 상임고문/ 대구·구미YMCA 전 사무총장] 아침밥이 감자다. 늦봄, 아니 초여름 어른 주먹보다 큰, 얼굴 같은 울퉁불퉁함과 모락모락 나는 김에 고슬고슬하니 쪄진 구름 같은 뜨거움이 옛 생각으로 깊숙하게 스민다.
밥숟가락을 들고 몰래 눈물을 훔친다. 아내의 눈치가 이상하리만치 잔잔하다. 엄마 생각이 난다며 눈이 벌겋게 올랐는데.....어릴 때 무척이나 정말 많은 날을, 아니, 거의 매일을 병치레로 보낸 날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집안 사정이란 바늘하나 꽂을 땅도 없었으니 무얼 하나 거두어 드리는 것조차 남의 일처럼 보였는데......아침 동이 들 무렵이면 남의 논에 감자 농사를 거들어야 내일의 식량이라도 마련할 텐데 싶어 골골하는 막내아들을 재촉하고 밖으로 종종걸음을 옮기시던 모습이 영화관보다 큰 스크린처럼 비쳐온다.
벌써 20년이 후딱 지나쳐 버렸다. 어머니의 굽은 허리를 처음 편 곳은 영안실이고 화장장이었는데 그렇게 부둥켜안았던 몸을 가루를 만들어 아버지의 곁에 두고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오늘 왜 이런 마음이 슬픈 하루가 시작되는고? 이 나이에 하루를 보내는 일이란 엄마가 먼저 가셨던 세상을 엄마 오리를 따라가는 뒤뚱거림일 뿐, 이제 따라가는 나이가 되었는데.... 쪼글쪼글하게 말라붙은 엄마의 가슴을 다시 그립게 만드는지 감자밥을 한 아내를 원망하듯 한소리로 눈물을 감춘다. “지금 감자가 제일 마싯제?”
양푼에 가득 으깬 감자 덩이에 김칫 국물을 마구 비벼대고, 그 숟가락을 입에 가져가면, 바로 없어져 버리는 신비를 실감한다. 그렇게도 먹기 싫었고, 그 밥을 주는 엄마가 그리 원망스러웠는데 이젠 ‘한입 가득히 넣어야 그 맛을 알게 된다’는 엄마의 옛말이 떠오른다. 우물우물할 사이도 없이 넘겨 버린다. 엄마의 생각을, 아니 엄마와의 슬픈 마음을 얼른 잊어버리기라도 하고픈지 삼킨다. 그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내에게 던진다. “아따 토실토실한 것이 다은이(외손녀) 뽈다구 것따 그제?”
현충일이다. 태극기가 반쯤 내려 걸려있고, 안중근 의사와 조마리아 여사의 옥중서신을 읽었다. 어머니에 대한 존경과 순종이 나아가 어머니의 피를 갈아내는 절규가 마음을 더욱 심하게 흔들어 놓는다. 그나, 그의 어머니에게는 견주기는커녕, 감히 쳐다보는 것조차도 감읍해야 할 내가 내 어머니를 그린다. 이 시절 그 흔한 찐 감자 한 덩이로 말이다. 어머니는 방 안에 가득한 공기인 듯 곁에 계시는 듯하다.
세상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지만 다른 이들을 ‘눈에 보이게 하는 힘을 가진 사람 또한 많다. 투명 인간이 된 듯한 감정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런 이유로 나는 사소한 것들의 존재감을 예찬한 시인, 소설가, 극작가에게 커다란 고마움을 느낀다.(마리나 반 주일렌, 『평범하여 찬란한 삶을 향한 찬사』(p44)에서
-
01[새벽칼럼] 임종 직전 김상조 전 도의원이 ‘현장에서 남긴 유언’...서거 3주기에 생각한다.. 2025/07/29 11:06

-
022차 공공기관 이전 ‘긴장해라’는 지적에 구미시 ‘실망시키지 않겠다`.. 2025/07/29 19:23

-
03[분석] 구미 지방선거, 민주당 운동화 끈 조여 매자 긴장하는 국민의힘.. 2025/07/31 09:23

-
04김천시청 가서 배우라는 손가락질은 ‘옛말’... 요즘은 ‘구미시청 와서 배워라’.. 2025/08/01 08:35

-
05[기획] ‘애완견은 예뻐서 키우는 데 에티켓 없는 일부 견주들...목줄 미착용·배설물 방치, 천태만상.. 2025/07/30 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