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
그것들이 어쩌면
간 밤
모이고 또 모여서
울었을지도 모른다
그 시간들이
어쩌면
세월들이...
 |
누군가인가
살아 돌아와서
만난 적이 있는가
이 기막힌 현실
새벽이 온다
그래도 우리는 살아간다
아주
아주 멍청이처럼
 |
누가 삶을
명명했다는 말인가
우리 마누라가 가슴속으로
아주 조용히
걸어 들어온다
 |
‘상처없는 나무는 없어...’
편백나무...
들여다 보았다
어찌하여
상처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아주 아름답게..,
싱싱하다
 |
우리 편백나무는
 |
가슴에도 강물이 흐른다는
걸
알았다
 |
미안타
누군가가 말을
걸어온다
바람이...
그리하여
그것들이
새벽을
몰고오는 것이었다
그래도...
된장찌개에다
혹은
현관문
아주
가볍게 안아주는
아내
혹은 남편이
햇살처럼
길게 가슴을 내려놓았다
우리들
그 좁은 화장실에서
짧게
사랑해 여보
혹은 아주 길게
울어버렸다
바보
천치처럼
[시인 소설가. 김경홍]
저작권자 K문화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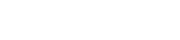





 홈
문화
홈
문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