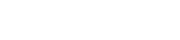more
 홈
문화
홈
문화
[살며 살아가며] 매일 걷는 구미시 봉곡동 그 노인, 절망한 중년을 일으켜 세웠다
김경홍 기자siin0122@hanmail.net 기자
입력 2023.04.02 05:04
수정 2023.04.03 06:50
[k문화타임즈 = 발행인 김경홍] 살을 도려내려는 듯 겨울 한파가 달려들고 있었다. 새벽 햇살이 거리에 가는 기침을 토해냈다. 건물 외벽에 등을 기댄 채 가늘게 눈을 감은 중년 사내의 등을 누군가가 흔들어댔다. 노인이 손을 내밀었다. 후들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운 그 사내의 눈가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보름 넘게 중년 사내는 거리를 떠돌고 있었다. 밀린 월세를 닦달하는 원룸은 출입을 막아섰다. 어쩌면 그가 숨이 막힐 것만 같은 작은 공간을 빠져나왔을지도 모른다. 사내의 주머니 속에는 수십 방울의 수면제가 들어있었다. 하루하루가 지옥인 삶은 수면제로부터 탈출구를 찾고 있었다.
코로나는 그를 벼랑으로 내몰았고, 고금리는 고달픈 삶을 벼랑 끝으로 밀어냈다.
직장을 그만둔 그는 퇴직금과 대출금으로 새로운 출발을 했다. 하지만, 어렵게 문을 연 식당으로 코로나가 몰려들었다. 손님들은 등을 돌렸다. 그 빈 자리에는 대출금 이자 납부 독촉장이 수북하게 쌓여갔다.
어느 날 식당 문을 폐쇄하고 귀가한 아파트 안은 온통 빨간 차압 딱지였다. 눈물을 토해내며 아파트를 나서는 아내는 내미는 손을 뿌리쳤다. 휘청거리는 걸음에 매달린 어린 딸이 뒤를 돌아보며 눈물을 토해냈다.
 |
| ↑↑ 새벽길. [사진 출처 = 불로그 사람과 삶] |
건물 외벽을 빠져나온 노인은 국밥집에서 중년 사내와 마주 앉았다.
“몸부터 먼저 추스르게나.” 수저를 내민 손은 상처투성이었다.
봉곡동 거리를 매일 걷는 그 노인... 십오년 전, 야근을 하고 오는 새벽에 교통사고를 당했다. 중환자실 호흡기에 목숨을 의탁한 몸은 의식 불명이었다.
생과 사를 넘나드는 힘겨운 싸움 끝에 의식을 회복했지만, 온통 상처투성이였고, 반신불수였다.
입원 후 2년 만에 집으로 돌아왔지만, 반신불수를 맞이한 집안에는 절망감이 넘쳐났다. 대학을 그만둔 아들과 딸은 일터로 향했고, 아내는 아파트 청소일을 하며 끊길 듯한 생활을 간신히 이어 나갔다.
수년간에 걸친 절망 속에서 빠져나온 그가 목발을 짚고 재활에 나서겠다고 입을 앙다물었다. 하루 종일 봉곡동 거리를 걸어다닌 세월이 십오 년이었다. 1년 전 목발을 집어던진 노인은 요즘 소일거리를 찾기 위해 생활정보지를 집어 든다고 했다.
노인이 국밥을 비운 사내의 손을 따스하게 붙잡았다.
“세상에 죽으라는 법은 없네. 힘을 내게나.”
오랫동안 망설이던 중년 사내가 무겁게 걸음을 뗐다. 멀리 원룸촌에 새벽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코로나 한파가 한풀 꺾이자, 고금리와 고물가가 삶의 일상을 옥죄고 있다. 만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긴 한숨을 뿜어댄다. 은행 쳐다보기가 두렵다고 하고, 바구니를 든 주부들은 장을 보려면 겁이 난다고 한다. 삶의 일상이 행복으로 어우러져야 할 이마에는 깊은 이맛살이 파도치고 있다. 상대적 박탈감까지 더해지면서 삶의 끈을 놓고 싶다는 아우성이 거리에 넘쳐난다.
수천만 원의 빚에 쫓기고 있다면 수억 원의 빚더미 속에서 신음하면서도 허리끈을 졸라매고, 수십억 원에 쫒기면서도 결연히 맞서는 이웃을 돌아보며 힘을 내야 한다. 식당 임대세를 내고 나면 입에 풀칠하기조차 힘든 삶의 저편에는 임대세마저 내지 못한 이웃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더 낮은 곳을 돌아보며 주먹을 움켜쥐어야 한다. 허리끈을 졸라매고 한파를 헤치며 묵묵히 일터를 향해 걸어가야 한다.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삶이 어디 있으랴. 흔들려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새로운 삶의 세계가 열리는 법이다.
우리들의 몸속에는 눈물의 보릿고개를 오르내리며 우리를 길러낸 부정과 모정의 힘이 살아있지 않은가.
우리들의 가슴에는 IMF를 이겨낸 눈물의 세월이 흐르고 있지 않은가.
저작권자 K문화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