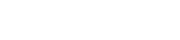홈
칼럼
홈
칼럼
[새벽칼럼] 어느 무명시인의 낡은 원고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k문화타임즈 =발행인 김경홍] 며칠 전 책장을 정리하다가 낡은 원고 뭉치를 발견했다.
원고지를 넘기자, 볼펜으로 휘청휘청 써 내려간 시구에 시선이 멈췄다.
“바늘귀에 실을 꿰어달라던 / 눈먼 어머니/ 객지로 나가는 아들이/ 마냥 안쓰럽던 어머니가/호롱불 밑에서 터진 양말을 깁던/ 그때/ 그동안 무엇을 위해 살았으며/ 지금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선잠에서 깨면 스쳐 지나는/ 깊은 산에 불빛 한점/ 내리고 싶은 곳에서 내릴 수 없는 게 삶이다/
<1988년 12월 4일, 귀성열차 전문>
그 무명시인과 마지막 만남은 하얀 겨울이 한라산 등허리를 뒤덮던 1989년 1월경이었다. 그리고 그 이후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다. 19990년 가방 하나 달랑 매어 들고 서울 속으로 사라졌다는, 흘려들은 얘기가 전부였다.
전두환 군사독재가 세상을 뒤엎던 1980년대 3월 초 대학 입학식 날, ‘진실과 정의 구현’를 외쳐대는 총장의 연대를 뒤엎으며 길게 울던 그였다.
학생처로 끌려간 이튿날 돌아보지도 않고 학교 문을 나서던 그 무명시인이 문득 절절한 2024년 7월이다. 살아있다면, 과연 그는 지금 어떤 길을 헤치고 있을까. 끼니는 잇고 있을런가.
1987년 이문열 작가가 세상에 내놓은 단편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막막한 세상의 덤불 속에서 그래도 살아남기 위해 길을 찾아 헤매 돌아야만 하는 지금, 진한 감동을 준다.
공직에 있는 아버지의 좌천으로 시골 초등학교(초등학교)로 전학을 오게 된 공부 잘하는 한병태는 급장인 엄석대에게 충성하는 학우들의 모습과 담임 선생님마저 묵인하는 모습에 경악한다.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은 뛰어난 우등생으로 알아서 복종하는 학생들은 병태에게도 복종을 강요했지만 단호하게 거부한 그는 다양한 민주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담임마저 묵인하자 결국 무너진 병태는 석대의 2인자로서 만족해야 했다.
그러나 새로 부임한 담임은 부정을 알게 되고 학생들에게 고발할 것을 요구하면서 충성을 다했던 아이들이 엄석대를 배반하자, 그는 교실을 박차고 나가 소식을 끊어버렸다.
이문열이 역작 ‘일그러진 우리들의 영웅’의 배경은 이승만 정권이다. 독재정권의 문제점을 말하면서도 그러한 상황에 순응하며 생존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서민들, 과연 먼 생의 길을 걸어와 오늘을 살아가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래서 그 무명시인의 쓴 귀성열차의 시구 중 ‘그동안 무엇을 위해 살았으며/ 지금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선잠에서 깨면 스쳐 지나는/ 깊은 산에 불빛 한점/ 내리고 싶은 곳에서 내릴 수 없는 것이 삶이다’가 가슴을 친다.
아이들이 자라나는 만큼 ‘내’가 앉을 자리는 더 좁아지고, 좁아지는 상황에서 ‘동물적 생존’의 길을 가야만 하는 ‘나’를 닮은, 이 땅의 평범한 장년과 노년들.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그릇됨을 그릇됨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나’는 어느덧 사회적 약자의 길에 만족해하거나 설령 그것이 그릇되었다고 하더라도 ‘한 번만 눈감고 가자’며, 자족하고 있는 게 아닐까.
단편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다시 한번 읽고 싶은 7월의 오후다.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말하면서도 그러한 상황에 순응하면서 생존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서민들 혹은 ‘나’.
문득 깨어나 보니, 내 생각은 열이틀 전의 시계추에 매달려 있다.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에게 양보를 강권하는 냉정한 사회, ‘권력자가 양보하면 포용이요, 약자가 양보하면 굴욕’이라는 엄연한 명제 앞에서도 권력자가 양보를 강권하고 살아남기 위해 순응해야 하는 시대, 오늘도 ‘나’는 굴욕의 추억을 곱씹어 먹으며 그 기운으로나마 길을 간다.
‘검찰 권력보다 강한 게 핵이고, 핵보다 더 강한 게 생명’이라며, 수사관의 책상을 쳐대던 20대의 패기를 뒤로한 채 다시 길을 간다. 살아남아 그 길을 끝까지 가야만 생의 벼랑 끝에서 ‘권력도, 부도, 명예도 지나고 보니 한낱 부질없는 꿈’이었음을 깨닫는 그 모습이라도 볼 게 아닌가.
-
01[기획] 구미 출신 법조인, 법무장관은 놓쳤으나 검찰총장은?.. 2025/08/05 12:59

-
02[기획] 이재명 대통령 대구경북신공항 조기건설 시그널에 부상하는 허복 의원의 ‘박정희국제공항’.. 2025/08/03 16:20

-
03[단상단하] 구미정치권 관심사안으로 부상한 8·15 특별사면.. 2025/08/05 08:49

-
04[기획] 선산권엔 5산단, 구미권엔 문화선도산단 (문화6산단) ... 쌍두마차에 시민적 기대감 증폭.. 2025/08/04 09:35

-
05요즘은 억대 농민이 수두룩 ... 참기름․들기름 제조업체가 연간 매출 13억 부자.. 2025/08/03 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