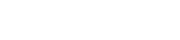more
 홈
문화
홈
문화
[새벽칼럼] 늘그막에 2→ 나이 70세에
김미자 기자 cloverail@hanmail.net 기자
입력 2024.06.09 19:47
수정 2024.06.09 19:51
[김영민=K문화타임즈 상임고문/ 대구·구미YMCA 전 사무총장]스물, 한창 피가 끓어오르던 때 ‘투쟁’, ‘민주’를 외치다가도 저녁이면 학교 앞 선술집에서 막걸리 잔을 기울이면서 부르던 노래가 지금도 잊을 만하면 찾아온다. 이 소리는 앞으로 맞이하게 될 시간에 대해 고민하고 힘들어도 했지만, 희망을 만들어주는 묘약이기도 했다.
 |
|
어느 곳에 어떤 얼굴로 서 있을까.
나이 서른에 우린 무엇을 사랑하게 될까.
젊은 날의 높은 꿈이 부끄럽진 않을까.
우리들의 노래와 우리들의 숨결이
나이 서른엔 어떤 뜻을 지닐까.
그런데 반세기가 훌쩍 흘러갔다. 외쳐 부르던 그 노래가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시작은 딱히 언제부터였는지.....아마 출근할 곳이 없어진 이후였으리라.
눈을 뜨자마자 물걸레로 방바닥이며 거실, 책장 등을 훔쳐낸다.
어제 대로변에 붙은 집의 창을 통해 들어왔을 먼지를.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이 닦아낸다.
밤새 꿈에서 즐거웠던 것, 괴로워서 눈물을 흘렸던 일 등을
고교 시절 교실 청소하듯 밀대로 구석구석 밀어낸다.
눈인사도 못 한 베란다의 꽃들에게 싱긋 미소를 보내고,
어설프게 만든 지지대를 타고 올라가는 어린 나무에게도.
‘샅에서 요령 소리 나고 궁둥짝에 비파 소리 나게 달려온 날들’이었는데
새로운 일상이 아심찮다.
쫓길 일도 없는데 아침이라 밝아오는 시간이면 무엇인가를 해야 할 것 같아 허둥댄다. 이제 내게 남는 것이란 시간뿐인데.
같이 놀면서 즐거움을 나누자고도 한다. 몇몇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하는 만남에 같이하자 한다. 헤아리기도 힘든 강좌, 강의, 순례, 전람회, 공연, 생게망게한 일들이 부른다.
해가 넘어가면 아내와 저녁의 집 앞 작은 동산을 걷는 일이 새 일과다.
빠짐이 없다. 철이 들고는 처음이지 싶다. 손을 잡고 걷는다.
어색한 쑥스러움에서인지 어느새 송골송골 땀이 맺힌다.
지난 비에 시집간 딸의 집에 물이 물 들어왔다느니,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외손녀가 생일에 보낸 준 그림과, 동네 집값이 어떻고, 공원이라며 집 장사하는 데 지방정부가 짝짜꿍이 되었다며 흥분하고, 서로 사람답게 살아야겠다고 하는 나라의 딱한 아우성으로. 이윽고 전 세계 전쟁, 기후 문제 등 급기야 죽음에서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 언거번거한 모양새, 그러다가는 뼛성을 내는 것이 희떠울 뿐이다. 언제나 그 말이 그 말이지만 그래도 새롭고...
끝이 없다.
돌아와 앉은 책상 위에 읽던 책의 갈피가 부른다.
어제의 생각을 더듬으며 책을 펴서 한줄 한줄에 눈길을 준다.
오늘 하루의 결정과 선택이‘존엄했는지’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를 돌아본다.
“일깨움이란, 문제에 따르는 모든 가능한 해답을 앞에 제시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가장 적절한 것을 스스로 알아서 결정하도록 준비시키거나 발생 가능한 모든 장해 요소를 그려봄으로써 스스로 해답을 찾는 것이기 때문이다”(페터 비에리 『삶의 격』, 2022, )1)
그리고 또 오늘 하루가 간다
1) P47, 법률의 존재 의미와 목적이 투명하게 유지될 때만이 존엄성이 보장될 수 있다(빌헬름 훔볼트)
저작권자 K문화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01[분석/ 미리 보는 2026년 구미지방선거·2] 구미갑구 5개 시의원 선거구 정당별 당선 가능성은?.. 2025/06/05 01:09

-
02[분석/ 미리 보는 2026년 구미지방선거·3] 구미을구 5개 시의원 선거구 정당별 당선 가능성은?.. 2025/06/07 13:45

-
03[선관위 위탁선거] 구미시 상모새마을금고이사장 재보궐· 금오공대총장 선거 7월 23일.. 2025/06/07 08:53

-
04[기획] ‘이제, 이재명정부가 약자의 편에 서야지 않겠나’...6·25 미군 폭격기 오폭·양민학살 사건.. 2025/06/06 12:11

-
05[기획] 62년 만에 경북2호 대통령 탄생시킨 안동 정치사...구미 박정희·안동 이재명.. 2025/06/08 1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