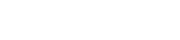more
 홈
문화
홈
문화
이복희 시인의 시집ᐧ오래된 거미집 / 연재 13- 홍매화 열반
김미자 기자 cloverail@hanmail.net 기자
입력 2024.05.20 02:15
수정 2024.05.20 02:19
절정인 홍매화 보시라고
화엄사 각황전 꽃살문 열어뒀다
절간에 깃든 요염한 자태
도반들은 사문에 들기 전
색주가 배꼽 예쁜 여자를 몰래 떠올렸다
붉게 물들인 경내에서
열반의 소망은 붙었다 꺼지는 심지
그을음만 남을 줄 알면서
터진 꽃망울 걷어차고 간 흰 구름에게
염화미소가 부처의 답이다
무언가 탁, 터지는 소리
몸속에 피던 꿈들도
심지의 눈빛에 걸릴 때
눈물이 촛농처럼 왈칵 쏟아지겠지
숨 몰아쉬며 홍매를 바라보던 부처가
연화 좌대에 얹어 둔 무릎 아래쪽을
슬쩍 꼬집는 순간,
만개한 홍매화
예불 울리는 자태가
물고기 떼 주렁주렁 매달린 열반의 세계다
|
|

|
|
|
↑↑ 이복희 시인 [사진 제공= 작가] |
◆ 이복희 시인 -----------------------------------------------------------------
경북 김천 출신으로 구미에 터를 잡았다. 2010년 ‘문학시대’에 수필, 2022년 계간‘시’에 시가 당선되면서 한국 문단에 명함 (수필가·시인)을 내밀었다.
‘오래된 거미집’은 이 시인의 첫 시집이다.
릴리시즘의 정수를 잘 보여준다는 평을 얻고 있는 시인의 작품‘ 오래된 거미집’을 연재한다.
저작권자 K문화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01[기획] 이재명 대통령 대구경북신공항 조기건설 시그널에 부상하는 허복 의원의 ‘박정희국제공항’.. 2025/08/03 16:20

-
02[단상단하] 구미정치권 관심사안으로 부상한 8·15 특별사면.. 2025/08/05 08:49

-
03[기획] 선산권엔 5산단, 구미권엔 문화선도산단 (문화6산단) ... 쌍두마차에 시민적 기대감 증폭.. 2025/08/04 09:35

-
04요즘은 억대 농민이 수두룩 ... 참기름․들기름 제조업체가 연간 매출 13억 부자.. 2025/08/03 16:35

-
05순수세계에 고운 영혼의 옷을 입히다 ... 오경숙 제17회 개인전.. 2025/08/04 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