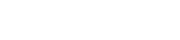more
 홈
문화
홈
문화
이복희 시인의 시집 ᐧ오래된 거미집 / 연재 7- 그날의 국수
김미자 기자 cloverail@hanmail.net 기자
입력 2024.02.15 22:14
수정 2024.02.17 23:57
어머니가 미는 축구공만 하던 밀가루 반죽
마당 그늘을 둥글게 늘였다
아버지가 지핀 아궁이 잔불에
내가 굽는 국수 꽁다리 냄새가
그날, 화약 냄새 같다며
코를 틀어쥐던 아버지
두리반에 올린 국수 앞에서
가닥 진 기억 끈을 건져 후루룩거리다가
넘어오는 슬픔을 꾸역꾸역 되삼키고 있었다
국수를 먹는 저녁, 총총한 별빛이
마당 가득 내려앉아 엿듣고 가는
1930년생, 아버지의 6.25 전쟁 이야기는
늦여름 풀벌레가 대신한다
강제 징병 되어 불려가던 날
좋아하는 국수라도 먹고 가라는
어머니를 뒤로한 채 흘리던 두 줄기 눈물
포탄을 나르며 참호 파다 익힌 삽질
평생 업이 될 줄 어찌 알았으랴
덜 썰린 대파 모양 굵은 흉터가
고사목 등허리 두줄로 자리 잡아
내가 부어드리던 등목의 물이
또르르 맺혀 흐르지 못하는 그곳
숨겨진 화약고였음을 또 누가 알까
참전 용사 보훈 대상자 서류는 제출했지만
반송되어온 봉투 속엔
당 ·신 · 이 · 름 · 석 · 자 · 찾 ·을 · 수 · 없 · 다
쿡쿡 박힌 활자는 반죽 덜 된 국수처럼 끊겼다
두리반 아버지 국수 그릇 위로
흥건히 남은 국물의 일렁임 속에서
나는 본다, 그날 통증의 참호는
오늘도 어쩌면 내일도
초록 숲 위장막 속에 든
벌레울음 섞어 넣은 반죽
어머니 손톱 저리도록 국수 밀게 하는 것이다

|
|
↑↑ 이복희 시인. [사진 = 작가] |
◆ 이복희 시인
경북 김천 출신으로 구미에 터를 잡았다. 2010년 ‘문학시대’에 수필, 2022년 계간‘시’에 시가 당선되면서 한국 문단에 명함 (수필가·시인)을 내밀었다.
‘오래된 거미집’은 이 시인의 첫 시집이다.
릴리시즘의 정수를 잘 보여준다는 평을 얻고 있는 시인의 작품‘ 오래된 거미집’을 연재한다.
저작권자 K문화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01[분석/ 미리 보는 2026년 구미지방선거·2] 구미갑구 5개 시의원 선거구 정당별 당선 가능성은?.. 2025/06/05 01:09

-
02[분석/ 미리 보는 2026년 구미지방선거·3] 구미을구 5개 시의원 선거구 정당별 당선 가능성은?.. 2025/06/07 13:45

-
03[선관위 위탁선거] 구미시 상모새마을금고이사장 재보궐· 금오공대총장 선거 7월 23일.. 2025/06/07 08:53

-
04[기획] ‘이제, 이재명정부가 약자의 편에 서야지 않겠나’...6·25 미군 폭격기 오폭·양민학살 사건.. 2025/06/06 12:11

-
05[새벽칼럼] 새 행수1) 에게.. 2025/06/05 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