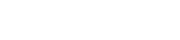more
 홈
문화
홈
문화
[시와 삶] 우리들의 어머니
김경홍 기자 siin0122@hanmail.net 기자
입력 2023.05.23 23:52
수정 2023.05.24 00:06
어머니를 엄마라고 부른 유년이 있었다
장독대, 그 캄캄한 세상에서 아주 살며시
|
|

|
|
눈물을 퍼 올리던 우리들의 엄마는
멀리 능선에 둥지를 틀곤 했다
그해 겨울에는 유난히도
함박눈이 쌓였다
새벽보다 먼저 일어난 엄마는
가슴 깊이 담가놓은 김장김치를 품어 들고
자취방으로 걸어들어오곤 했다
|
|

|
|
먹어도 먹어도 고프기만 하던 학창시절
엄마는
김장김치에다 모락모락 쌀밥상을
남겨놓고 등을 돌리셨다
눈물을,
웃음으로 감추는 비법을 터득한
우리들의 엄마는
자주 고개를 돌리곤 하셨다
그리하여 나 또한
가슴에도 눈물이 흐른다는 사실을
알아버렸다, 학창 시절
|
|

|
|
경부선 하행 야간열차
멀리 능선에 등잔불이 가물거린다
엄마는...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 없는
이 길
조용히 아주 조용히
세월을 거슬러 오른다
“얘야, 밥은 먹고 다니니...”
낚아올린 세월
그렁그렁 눈물들이 피고 또 지고 있다
|
|

|
|
늙어버린 우리들의 엄마는
잠도 없이
또 언제 내 가슴 한켠에 둥지를 트셨을까
가만히 가만히 비가 내린다
오늘 아침도
가슴의 밭 사철나무 숲 그늘 아래
김장김치와 모락모락 쌀밥상을
차리셨다
가슴의 밭에 둥지를 튼
우리들의 엄마는...
|
|

|
|
이 좋은 늦봄 날
엄마는
가슴의 밭에 오래오래 잠이 드셨다
[시인/소설가 김경홍]
저작권자 K문화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