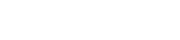홈
문화
홈
문화
[새벽 편지] 취함의 정치인과 불행한 여생...문경 보현정사 길목의 감나무는?
[발행인 김경홍] 80년대를 풍미하던 사회철학 서적 중의 하나가 한완상의 민중론이다. 주요 핵심은 이렇다.
“의식이 부재하면 몰려다니는 군중이 된다. 마치 짐승의 무리와도 같은 게 군중이다. ” 그 반대의 개념이 민중이다.
의식으로 무장한 당초의 민중은 ‘나보다 남, 나보다 집단’을 우선하는 존재가치였다. 하지만 이들은 이기주의와 선민의식이라는 사생아와 만나면서 ‘남보다 나, 집단보다 나’를 위한 존재로 변질했다. 그 부류들이 국민을 수단시하는 2023년 한국의 정치, 나라와 민족을 욕망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저질의 정치인들이다.
함박눈이 내리는 12월 중순, 문경 보현정사를 가는 길목 어귀에 매달린 글귀가 걸음을 멈춰 세운다.
“강물은 강을 버려 바다가 된다‘
둔덕을 내려온 겨울바람이 휑하게 몸을 드러낸 감나무의 마지막 잎을 떨궈낸다. 오 헨리의 마지막 잎새처럼.
코로나의 횡포가 엄습했던 거리, 오가는 이들의 어깨가 꺼져있다. 덜커댕대는 상가의 출입문, ’임대‘ 안내문이 바람을 만나 너펄댄다. 이름없는 그 무명의 존재들은 하루 세 끼니를 어떻게 구할까.
3백만 원하는 고관대작 부인의 명품가방이 민생을 울리는 세상이다. 1천200억 원의 코니를 거래한 정치인의 과욕이 기를 막히게 하는 겨울 길이다.
아우의 출세를 바랐던 형은 뒷바라지를 위해 힘겨운 삶을 택했다. 결국 형의 희생에 힘입은 아우는 과거에 급제해 요직에 등용됐다.
하지만 몇 년이 흘러도 기별이 없자, 형은 몇 날 며칠을 걸어 한양에 거처하는 아우의 집을 찾았다.
그러나 내놓은 밥상에는 보리밥과 김치 조각이 전부였다. 돌아서 나오려는 형의 옷소매를 부여잡은 아우가 눈시울을 붉혔다.
”백성들이 굶어죽어나가데 어떻게 호의호식을...“
조선시대 어느 판서의 얘기다.
3백만 원 하는 명품가방의 가격은 길거리에 나앉은 민생들에게는 천금만금의 가치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한 달 월급이기도 하다.
’버림보다 취함‘에 길들여진 그들에게 민생은 어떤 모습일까,
버림을 미학으로 삼는 정치, 이 나라에는 조선시대 그 판서가 몇이나 될까.
마지막 잎새까지 겨울에게 내준 문경 보현정사 길목의 감나무, 버렸으므로 오는 봄날에는 꽃을 피우고, 가을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래서 과욕을 부린 정치인들의 여생처럼, 가을은 고독하지도, 불행하지도 않을 것이다.
-
01이상호 의원 ‘수의계약 특정업체 집중 체결’ 주장에... 구미시 ‘투명성·공정성 위배하지 않았다’ 해명.. 2025/07/17 21:55

-
02[단상단하] 이지연 의원에게 또 ‘꾸중(?)’들을 때가 됐다.. 2025/07/18 09:05

-
03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주는 수의계약 특혜...이상호 의원, 투명성·공정성 `심각한 우려`.. 2025/07/16 08:48

-
04국민체육센터 짓기만 하면 뭘 하나... 짓고 나면 ‘엉망진창’ 하자보수만도 60여 건.. 2025/07/17 13:02

-
05그날, 본회의장을 숙연케 한 김정도 의원의 호소... ‘과연 우리는 발달장애인 그리고 그 가족들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2025/07/17 23:24